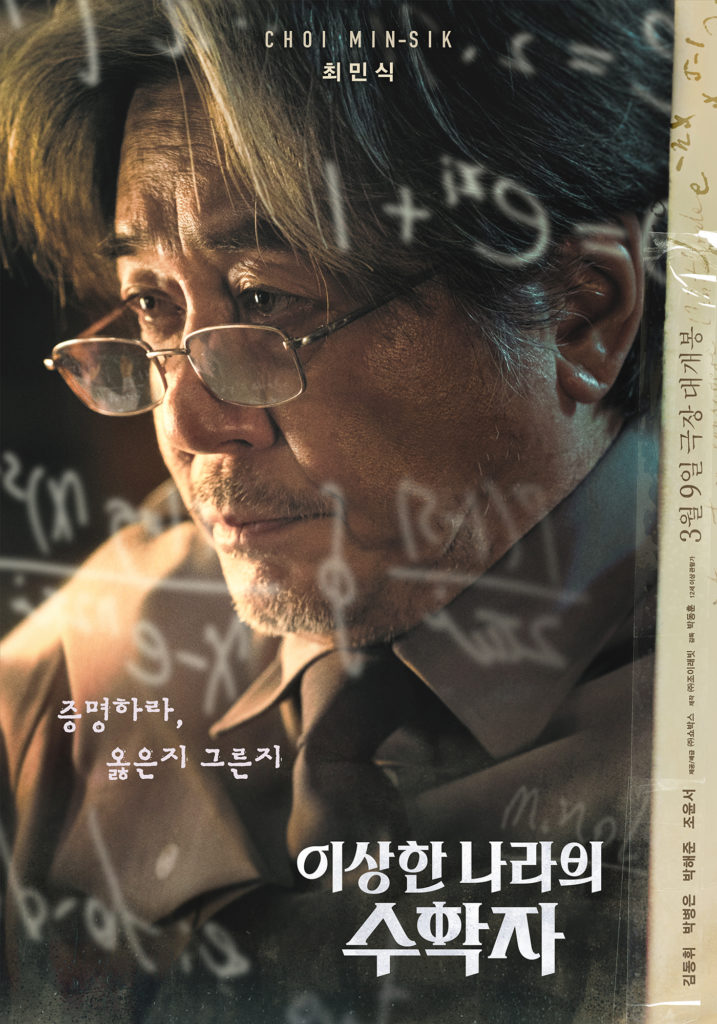나도 철없던 시절에는 수학을 학문으로 공부하고 싶더고 생각했던 적이 잠시 있었다. 영화속 주인공이 그냥 머리만 좋은게 아니라, 바흐의 음악도 사랑하고 수학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천재라서 부러웠다. 오로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별개의 사항은 아니지만) 개나 소만도 못한 인간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참 큰 문제구나하고 생각했다.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라는 단어를 이 영화를 통해 배웠는데 (설명도 안해줘서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어쩜 저렇게 취지에 어긋나서 낙인으로 사용되는지 참 안타까웠다 (설마 낙인으로 사용하려고 만든건가?). 머리도 노력도 아닌 용기가 있어야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주인공의 말에는 별로 공감이 안됐다.
데미안
영웅
리멤버
배심원들
살인의뢰
재심
결백
헌트
요즘 이런 장르를 팩트 더하기 픽션이라 팩션이라 부르는 것 같다. 질서(와 평화?)를 위해 살인마를 용인한다는 설정때문에 그저 맘상하는 영화. 이상하게도 이정재와 정우성 둘 다 나는 별로 (연기를 못한다는 소리는 아님).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으로 신인감독상도 받았다는데 뱅기에서 봤던 킹 메이커나 남산의 부장들보다 재미가 덜했다. 저 시절에는 진짜로 남한에 간첩이 (안기부의 높은자리까지 포함에서) 그렇게도 많았을까? 독재자 한명 죽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 있었을때 쓸데 없는 판결문(?) 읽지 말고 그냥 쏴서 죽여버리지. 물론 그랬으면 영화가 안됐겠지만. 전두환이 그리 호위호식하며 오래살다 편안히 간게 다시한번 짜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