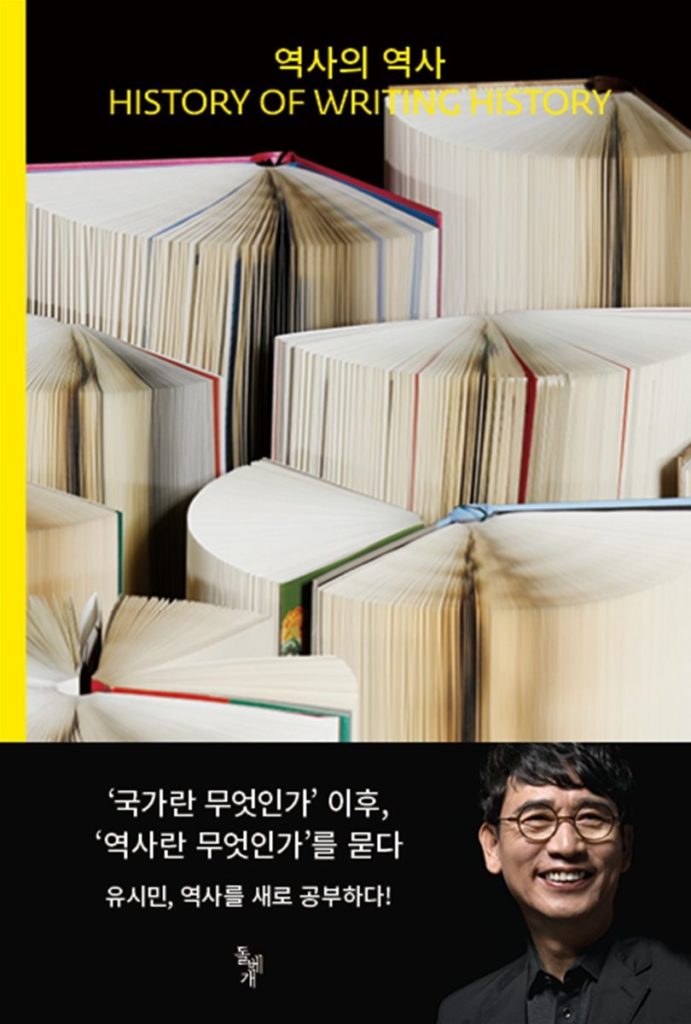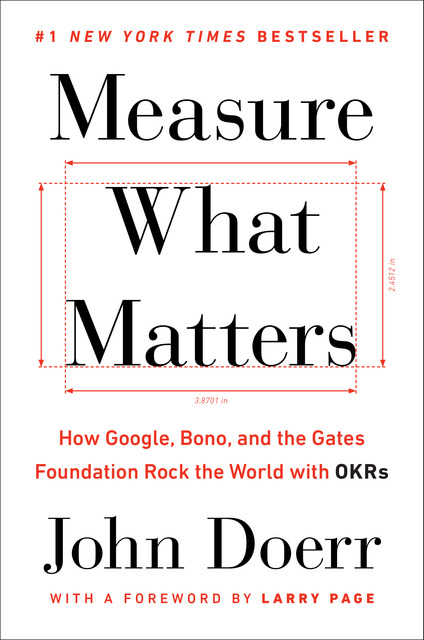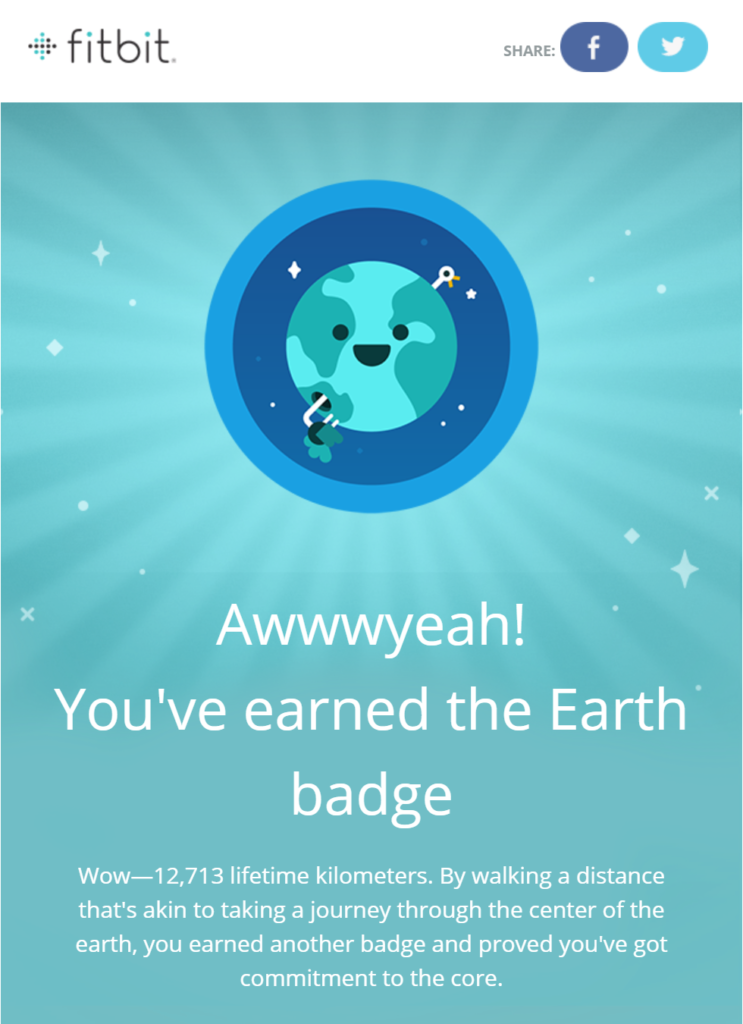사람이 죽어 나가거나 귀신이 나오지 않아도, 영화가 충분이 무섭고 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아무 이유없이 (단지 할 수 있으니까) 약한사람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한다 한다는 교훈을 전한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onth: January 2019
역사의 역사
나고 자란 조국을 떠나 타지에 살면서 여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려서 세계사 공부좀 열심히 할걸 하는 생각을 종종한다. 이책을 읽으면서 더욱 더 뼈저리게 느꼈다.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뭘 좀 알았으면 훨씬 재미있게 읽었을텐데 나의 무식함이 좌절스럽다. 그리고 유시민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읽기도 힘든 책들을 다 찾아읽고 (어떤 것은 몇번씩) 일반인이 보기 좋게 요약 및 정리를 참 잘했다. 그리고 친절하게 에필로그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무리 해주셨다.
인간의 본성과 존재의 의미를 알면, 시간이 지배하는 망각의 왕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그라질 온갖 덧없는 것들에 예전보다 덜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했다.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Measure What Matters
제목을 대충보고 Self-Tracking 에 관련된 책인줄 알고 사서 읽었는데,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Productivity 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와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결과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텔에서 시작되고 구글등 여러회사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훌륭한 방법인것 같기는 하다. 매니저랑 하는 1:1 이나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Connect 등등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는지 Detail 이 문제인것 같다. 대놓고 이렇게 따라하라는 책들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낭비는 아니었던 듯.
The Commuter
Ethiopia Misty Valley Natural
골든아워 1
동생이 시누이한테서 빌려왔는데 나보고 먼저 보라고 했다. 이미 읽고 있는 책도 있었고, 미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읽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얘기들이다 보니 흥미진진해서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책이라) 제법 빨리 읽었으나, 뒤로 갈수록 한국 의학계 및 정치계에 대한 짜증나는 현실과 그에 따른 저자의 체념 및 푸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그만 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래서 2권을 구해서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다.
독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Earth Badge
Bumblebee
당신이 옳다

심리학을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아 쓴 책이라서 그런지 조금 과한것 아닌가 싶을만큼 경험에 기반해서 책을 썼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실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제대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을 지지해주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이 당연한 듯 하지만 새로웠다. 우리 모두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은 꼰대질의 정반대가 아닌가 싶다.